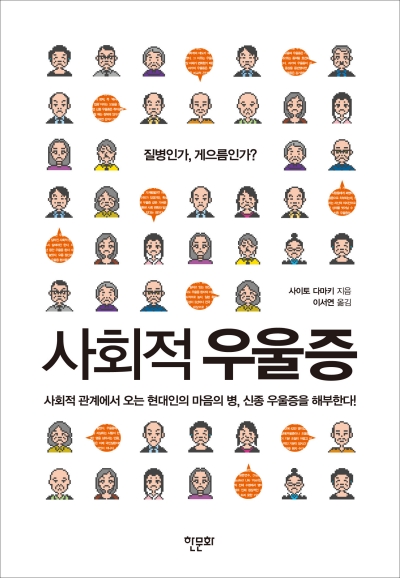
신종 우울증! 질병인가, 게으름인가?
최근 우울증 양상이 달라졌다. 퇴근만 하면 생기가 넘치는데 출근할 때는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아졌다. 증상은 심각해 보이지 않는데 약을 먹거나 휴식을 취해도 좀체 낫지 않는다. 일상생활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타개하지도 못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신종 우울증을 의심해야 한다.
최근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 신종 우울증은 증상이 가벼워 보여 의사들 사이에서도 질병으로 봐야할지 게으름이나 어리광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나 직장동료는 물론, 스스로에게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신종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신종 우울증=사회적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도 말할 만큼 우울증은 많은 사람이 겪는다. 성인 6명 중 한 명은 평생 적어도 한 번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수는 10년 전보다 63% 증가했다. 특히 20대 우울증이 지난 5년간 가장 급격하게 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전 세계 질병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각종 항우울제나 치료법이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우울증 환자는 왜 점점 더 늘어날까?
신간 『사회적 우울증』의 저자는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개념을 사회적으로 알려 관심이 쏠렸던 사이토 다마키 박사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소장파 정신의학자이자 임상의인 저자는 최근에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신종 우울증 환자들이 은둔형 외톨이와 닮았다는 데 주목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개인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도 우울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질병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사이토 다마키 박사는 『사회적 우울증』에서 우울증을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풀어간다. 은둔형 외톨이나 신종 우울증을 ‘개인의 병리’가 아닌 ‘가족과 사회 시스템의 병리’로 보았다. 증상은 가벼운데 낫기 어려운 이유도 그만큼 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종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모두 사회적 관계에서 찾기에 저자는 신종 우울증을 ‘사회적 우울증’이라고 부른다.
관계치료, 사람이 약藥이다
책의 1부는 이론편으로 신종 우울증의 배경, 사회적 우울증으로 보는 이유, 관계치료를 뒷받침해주는 회복 탄력성 이론과 코헛의 발달 이론을 살펴본다. 2부는 실천편으로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가족, 직장에서 신종 우울증에 대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종 우울증 환자는 내적으로는 대인접촉을 갈망하면서도 겉으로는 타인을 밀어내 스스로 고립된 삶으로 빠져드는 경향을 보인다. 신종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주변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개인과 가장 밀착된 환경인 가정과 직장에서 신종 우울증에 대처하는 관계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글. 김효정 기자 manacula@brain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