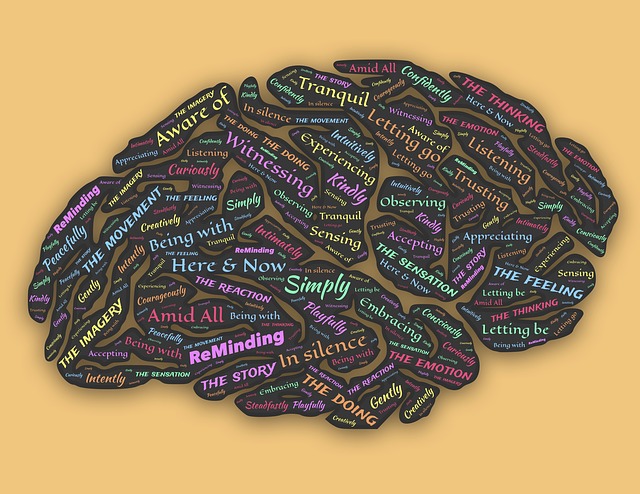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국제화 시대인 지금 매우 중요한 이슈중 하나입니다. 외국어 그중에서 특히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경제, 문화 그리고 학문적으로 많은 이점을 가져다줍니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들은 외국어를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다른 언어를 쉽게 배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점들은 뇌과학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이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들 알고 있듯이 언어발달 폭발 시기(Critical Period Hypothesis, CPH)라고 알려져 있는 생후 몇 년간 언어 습득 능력은 그 어떤 시기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뇌 가소성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기에 배운 언어를 흔히 모국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특정 나이가 되면 언어 습득과 관련된 뇌가소성은 떨어지게 되고 그 뒤부터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모국어와 제2외국어를 구사하는데 있어 뇌를 사용하는 차이가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무엇 때문에 뇌가소성이 다른 언어를 배우기 쉽게 만들어 주는 것일까요? 사실 모국어와 제2외국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논문들을 살펴보면 모국어와 제2외국어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측두엽 영역이 활성화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측두엽내에서도 활성화 되는 부위의 차이가 존재하며 전두엽 및 다른 영역들의 활동 역시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모국어와 제2외국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Schlegel 그룹이 2012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조금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해당 그룹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돼서 제2외국어를 배우면 전두엽의 신경다발 구조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는 제2외국어의 경우 모국어를 배울 때 형성한 네트워크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함께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제2외국어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기 때문에 뇌가소성이 활발한 언어 발달 시기에 이를 배우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없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Pallier 그룹이 2003년에 발표한 논문처럼 언어발달 시기 이후에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된 아이들이 프랑스어를 모국어같이 구사한다는 점에서 2차 언어 발달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2차 언어 발달 시기는 보편적이지 않고 개인차가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뇌가소성이 떨어진 시기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현지인처럼 구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쩌면 다음 연구결과가 그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Perani 그룹이 2001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2외국어를 현지인처럼 구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뇌 네트워크를 모국어와 공유한다고 합니다. 즉, 최대한 한국어를 쓰듯 뇌를 사용해야 외국어도 잘 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새로운 길만을 개척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길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폭발적인 뇌 가소성이 꼭 필요한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국어, 제2외국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정확히 이렇다고 이야기하기엔 이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건 일반적으로 제2외국어를 배움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뇌 네트워크를 개척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지만, 정말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모국어 네트워크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더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가 한국어를 사용할 때와 많이 동떨어진 방향으로 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만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강호중 한국뇌과학연구원 연구원
[1] JEONG, Hyeonjeong, et al. Cross-linguistic influence on brain activation during second language processing: An fMRI study.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2007, 10.2: 175-187.
[2] YOKOYAMA, Satoru, et al. Cortical activation in the processing of passive sentences in L1 and L2: An fMRI study. Neuroimage, 2006, 30.2: 570-579.
[3] SCHLEGEL, Alexander A.; RUDELSON, Justin J.; TSE, Peter U. White matter structure changes as adults learn a second language.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2012, 24.8: 1664-1670.
[4] PALLIER, Christophe, et al. Brain imaging of language plasticity in adopted adults: Can a second language replace the first?. Cerebral cortex, 2003, 13.2: 155-161.
[5] ABUTALEBI, Jubin; CAPPA, Stefano F.; PERANI, Daniela. The bilingual brain as revealed by functional neuroimaging. Bilingualism: Language and cognition, 2001, 4.2: 179-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