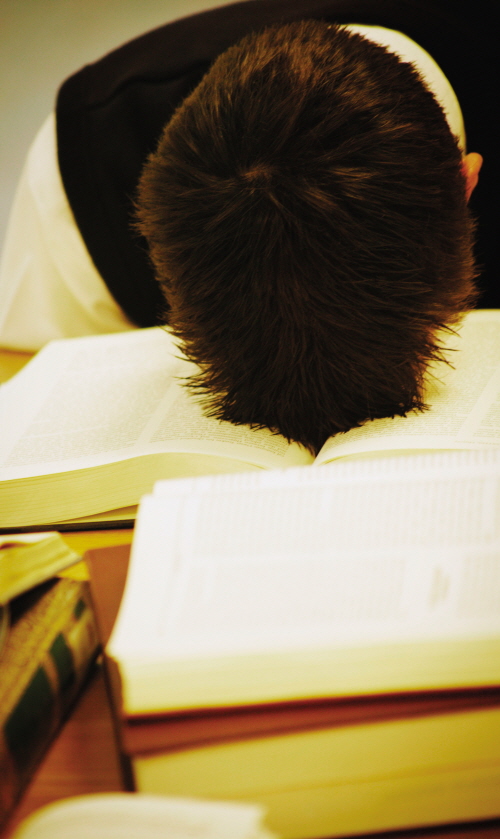
깨어 있어도 피곤하면 뇌의 일부분은 잠들어 있는 것
열쇠를 둔 곳을 깜빡 잊거나, 우유를 찬장에 넣고 시리얼을 냉장고에 넣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뇌의 일부분이 졸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피곤한 상태라면 의식은 깨어 있더라도 뇌는 전체적으로 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잠든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키아라 키렐리Chiara Cirelli 교수팀은 EEG(Electroencephalography)로 뇌의 전기파를 측정한 결과, 몹시 피곤한 상태에서는 눈을 뜨고 활동을 하는 중에도 일부의 뇌세포는 잠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반적으로 잠이 부족하면 뇌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 일부분의 뇌세포가 잠에 빠진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키렐리 교수는 “육체가 피로를 느끼기 전에 뇌는 이미 특정 활동을 멈추고 휴식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서 “깨어 있는 중에도 아주 미세한 졸림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운전 중에 조는 것도 뇌의 미세한 졸림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이전 연구에서 키렐리 교수는 초파리의 특정한 유전자를 변형시켜 30%정도 적게 자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초파리를 만들어냈다. 이 유전자는 포유류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약을 만드는 데 이 연구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돌연변이 초파리의 수명은 평균 수명보다 30% 짧다고.
좌뇌 우뇌 번갈아 교대로 잠드는 고래
부분적으로 잠드는 뇌를 가진 대표적인 포유류는 고래이다. 고래는 잠자는 동안 뇌를 절반씩 번갈아가며 사용한다. 고래는 폐로 숨을 쉬기 때문에 잠수해 있는 동안 체내에서 산소가 떨어지면 해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해면 위로 분수 모양의 물줄기를 내뿜는 모습은 바로 고래가 머리 윗부분의 숨구멍으로 숨을 내쉬는 순간이다.
고래는 해면 위로 올라와 충분히 산소를 들이마신 뒤 2시간까지 잠수할 수 있다. 숨 쉬기 위해 해면 위를 오르내려야 하는 고래의 습성은 수면 패턴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 자란 고래는 잠자는 동안 호흡하고 수영하는 기능을 한쪽 뇌로 조정하고, 다른 쪽 뇌는 쉬는 방법으로 하루 5~8시간을 잔다. 그런데 갓 태어난 새끼 고래는 아예 한 달 동안 수면을 포기한다고 한다.
새끼 고래가 태어나면 얼른 해면 위로 올라가 첫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때 어미가 새끼를 수면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제롬 시겔Jerome Siegel 박사 연구팀은 새끼 고래가 한 달간 잠을 자지 않고 어미를 쫓아다니며 해면 위로 수시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형 수조에 임신한 범고래와 큰돌고래 여러 마리를 풀어놓고 새끼가 태어난 후 1년까지 이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였다.
일반적으로 포유류는 출생 직후에 일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새끼 고래는 신체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불면증에 시달릴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양을 측정하자 새끼 고래 의 상태는 건강한 어른 고래와 유사했다. 새끼 고래에게 한 달간의 불면은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도 고래처럼 뇌를 반반씩 쓰면서 번갈아 잠들 수 있을까?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무시간을 가진 우리에게 숙면은 당면한 과제이다.

업무 능률을 높이려면 뇌를 알아야
몇 달 전, 우리나라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가 파업을 했는데 파업한 직원들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그 논란 속에서 해당 회사의 12시간 주야간 맞교대라는 근무환경이 새로운 논점으로 떠올랐다.
12시간 주야간 맞교대란 주간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조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밤샘 근무를 하는 구조이다. 이런 야간근무 형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등 문제가 많았을 뿐 아니라, 작업자의 실수로 인한 산재 사고는 늘고 생산 효율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잦은 야근으로 지친 사무직 직원의 뇌가 부분적으로 잠든다면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정도이겠지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앞에 12시간 동안 서서 일해야 하는 생산직 직원의 뇌가 일부분 잠든다면 이는 곧바로 제품 하자나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 이는 결코 회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것이다.
과거에는 인체공학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 기업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21세기에는 뇌과학이 그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의 뇌가 상품 선택에 반응하는 방식을 파악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뉴로마케팅이라는 분야가 그러한 예이다.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다. 진정한 생산 효율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이제 기업도 인간 이해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뇌과학에 관심을 갖고, 인적 관리를 비롯해 기업 경영 전반을 사람 중심, 즉 인간 뇌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글·강윤정 chiw55@brainmedia.co.kr